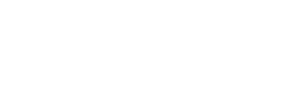내가 디지털영상을 배우는 학교엔 암실이 하나 있다. 흑백사진을 인화하는 곳이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소비량은 줄어만 가는데 사진과에서도 배우지 않는 암실수업이 영상전공 학과에 떡하니 있다. 사진과에서 고지식한 교수 하나가 넘어왔는데 영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니 머라도 가르친다고 가르쳤던 게 검은 방에서 약품냄새 풀풀 풍겨가며 사진 현상하는 수업이었다.
DSLR 카메라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암실수업은 필요한가? 난 필요 없다고 말해보겠다.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우리 교수님께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실 게 눈에 선하다. “사진이 발전해온 역사를 배우지 않고선 사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거나 “정성들여 사진을 한 장씩 인화해 본 사람만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디지털편집이 보급화 되면서 방송국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테이프 두 개를 동시에 기계 안에 넣고 복사를 했던 ‘리니어 편집’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넌-리니어 편집’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전에 비하면 너무 고생을 덜 한다는 이유였다. 고생을 하지 않는 편집,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태우지 않는 편집은 편집자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마 ‘오리지널’과 ‘본질’의 차이점을 오해하는데서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리지널’은 그야말로 시간상에서 앞서 존재했던 것들을 말하지만, ‘본질’은 그 사물의 존재의 목적에 더 가까운 것이다. 위의 사람들은 두 개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 고지식한 아저씨들을 보면서 원시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구석기인들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차례대로 맞으면서 기술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돌도끼를 쓰던 중, 청동도끼가 나오니 돌도끼를 버리고 쇠도끼가 나오니 청동도끼를 버렸다. ‘Orignal’이라는 단어에는 ‘기원이 되는’ 이나 ‘최초의’ 라는 좋은 뜻도 담겨 있으나 동시에 ‘구식의’라는 뜻도 함께 담겨있다.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새 기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한 구식에 정을 떼질 못한다. 이유는 사실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자신들은 그 기술을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다. 나이가 어린것들이 순식간에 배워버리는 그 기술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정체는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상대적인 퇴보를 겪게 되니 난감하여 헛소리가 저도 모르게 세어 나오는 것이다.
청동기인들은 새로 나온 쇠도끼를 보고 ‘이것이야 말로 도끼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끼는 도끼의 오리지널이긴 했지만, ‘날카롭고’, ‘단단하고’, ‘사용하기 편한’ 도끼의 본질에는 전혀 거리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이다.
필름 사진기가 사진의 역사에서 오리지널이긴 하겠지만, ‘선명하고’, ‘사용이 편하고’, ‘셔터스피드가 빠르고’, ‘색감이 좋고’ 등의 사진이 지향하는 목적까지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는 기계라는 것이다.
기계뿐만이 아니다. 파피루스나 대나무 또는 천 쪼가리 위에 글을 썼던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의 책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책의 의도나 목적에 가깝다.
성냥보다는 라이터가, 소보다는 트랙터가, 연필보다는 샤프가, 짚신보다는 나이키가,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삽보다는 포크레인이, 디스켓보다는 CD나 USB가, 편지보다는 e-mail이, 브라운관보다는 LED가 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술이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남겨진 사실들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발전되었고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기술은 개발되지도 않았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고, 자유로운 인간은 더욱 기술을 발전시켰다. 오늘날까지도 인간과 기술은 뗄 레야 뗄 수가 없다.
한참을 글을 쓰다 보니 나는 얼핏 기술 예찬론자처럼 보인다. 기술의 장점만을 떠들어댔다. 하지만 기술도 완벽하지 못하다. 내가 위에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구식의 것을 도태되게 만든 최신기술의 선두주자’ 쯤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술들이 가지는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율’이다.
효율이 대량생산체제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무지막지하게 쏟아냈다. 효율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도록 하였고 일부 인간은 비인간적인 계산기로 만들고 일부의 인간들은 낙오자로 만들어냈다.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린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효율에서 나온 것이며, 효율은 기술이 지향하며 달려가는 종착역이다.
인간의 손을 통해서 실현되지만, 전혀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은 인간의 친구인가? 적인가?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효율을 따지며 자가발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인정해야 할 암흑시대의 임박이다.
글을 쓰는 중에 글의 의도가 많이 바뀌어 이도 저도 아닌 글이 되었다. 시간도 늦었고 어딜 손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글은 이만 줄인다.
애초의 의도는 ‘기술은 발전하는 만큼 교육자는 퇴보한다.’는 의도였다.
몇일 전에 썼던 글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예술도 발전한다.’ 와 대칭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