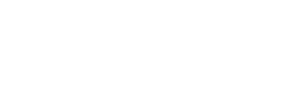성인이 된 직후, 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키웠다. 내 몸속에 그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마저 틀렸다고 간섭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신론자라는 타이틀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의 무신無神이긴 하지만, 신이 있건 말건 무신 상관이냐는 무신無信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여 반신反神론자나 불신不信론자로 불러 달라 했다.
그리곤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논리를 챙겨 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세계관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알았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는 당연히 과학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었다. 과학은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종교의 관점으로는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나의 근거였다.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르니, 종교인과의 세상 이해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나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외엔 별 목적도 없었다. 내뱉은 이야기가 서로의 고막까진 닿았을까? 주워들었던 논증을 더듬거리며 끄집어낼 뿐이었다.
난 오래 지나지 않아 반신론자가 아닌 불가지론不可知論자가 되기로 했다. 겸손해졌다기보다는 허무함이 들어서였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말을 함으로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말할 수 없기에 침묵해야 했다. 세상의 방대함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 하찮은 존재였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찮은 나 따위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내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해보았다. 아구가 좀 잘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과학 또한 상당 부분 가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은 제한적임에도, 그마저도 불확실한 감각기관에 의존해 읽어 들이고 있었다. 세계관에 대한 고집은 자연스럽게 꺾였다.
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추종했고 맹신해왔다. 종교를 극복한 게 아니었다. 과학과 이성을 그 대상으로 택해 종교 삼은 것이었다. 타인을 비방하는 데 바빴던 나는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삶에 대한 성찰이나 감사함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내가 비방하던 이들보다 나을 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생긴 신념의 공백 상태는 다행히도 금세 다시 채워졌다. 먼저 살다간 분들이 샘플 삼을만한 신념을 책에 많이 남겨둔 덕이다. 적극적으로 복제하기도 하고 나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신념은 다시 내뱉기도 하면서. 그리고 깨달았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태도라는 것을.
핸들을 잡지 않은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하다. 결국 내가 잡아야 할 핸들이지만, 가끔 겁이 난다. 핸들을 잡으면 피곤해도 졸 수 없고, 신경 써야 하는 게 어찌 그리 많은지. 주행 경험도 없을뿐더러,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을 생각하면 사는 게 너무 버겁다.
신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변에서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 담기도 한다. 내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atheist의 논리를 주워 담았던 것처럼.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부모, 선배, 친구, 소속된 사회에 제 핸들을 떠넘긴다.
나약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길 바라는 것. 나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 책임을 떠넘기면 당장은 홀가분하지만 이내 손해 보는 장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책임과 권한은 언제나 쌍으로 붙어 다니기에 권한도 함께 넘어간 탓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이양하는 셈이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치열한 시대에, 핸들을 선뜻 잡아주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독재자의 야욕, 자본의 탐식, 절제 없는 욕망 따위의 것들이 아니고서야 타인의 핸들에 관심 가질리 없다. 한 번 타인에게 넘긴 핸들은 다시 되찾아오기가 어렵다. 권한도 책임도 없는 평안한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삶의 통제권과 책임을 모두 내가 쥐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겁도 났다. 이제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고용주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시나 무겁다. 그런데 묘하게 안정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