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8월 ~ 2010년 3월, 약 8개월 동안 호주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브리즈번의 시내에 있는 이태리/그리스 식당이었고, 두 번째 식당은 멜번의 하드웨어 레인에 있던 POP Restaurant이었습니다. 그 곳엔 20개 정도의 노천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프렌치풍의 파인다이닝을 하고자 했던 헤드셰프와 수익을 위해 저가형 비스트로를 하자는 보스가 매일 같이 메뉴 변경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주방에 피자오븐이 들어왔습니다. 프렌치 요리를 하고자 했던 셰프는 그 사건으로 식당을 옮기겠다 선언했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다른 셰프님들보다 일주일 앞서 근무를 정리했습니다.
귀국 3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한 번은 내 손님이 되어주지 않겠냐는 수셰프 브라이언의 초대에 홀로 노천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가져가라고 욕을 했던 매니저가 무릎에 냅킨을 깔아주고 포크와 나이프를 세팅하며 저를 반겼습니다. 주방에서 봤을 땐 겉멋만 든 답답한 녀석이었는데 그 날 따라 꽤 젠틀한 녀석이었습니다. 이미 메뉴는 준비되어 있으니 고를 필요가 없다며 화이트 와인을 먼저 따라주었습니다. 달콤시큼한 샤도니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매니저를 꼬셔 와인을 빼먹은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배운대로 입안을 화이트와인으로 고루 헹궜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앙트레가 나왔습니다. 당근퓨레를 곁들인 송어구이, 브로콜리니와 관자구이, 허브 라임 드레싱을 곁들인 굴이 한 접시에 보기 좋게 담겨 나왔습니다. 그 앙트레는 분명 메뉴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혼자 노천 레스토랑에 앉아 있으려니 머쓱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항상 공연을 하던 밴드의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노래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왠지 다른 손님들보다 대접받았다는 생각에 우쭐해졌습니다. 앙트레를 마치고 남은 화이트와인으로 입을 헹구니 벌써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주방에서는 대머리 브라이언 셰프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문을 읽고 불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필렛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바삭한 감자 로스티 위에 미디움레어 아이필렛이 차분히 올려져 있고 사골육수로 우려내 버섯의 풍미를 더한 소스가 그 위에 끼얹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메뉴였습니다. 매니저가 잔을 바꿔 피놋누와 레드와인이 잘 어울릴 거라며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음식과 맛에 대해선 더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서 영문법도 틀린 이력서를 들고 여길 무턱대고 찾아왔던 그 날이 기억났습니다. 첫 2주 동안 접시만 닦다가 타파스와 디저트를 맡아 달라고 했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일찍 나와 남의 일을 훔쳐 했지요. 저를 휘어잡으려고 대머리 브라이언 셰프가 온갖 트집을 잡으며 욕을 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몇 일 전 굿바이 파티에서는 서로 껴안으며 작별인사를 했었지요. 음식을 먹을 줄도 모르면서 분위기 때문에 프렌치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은 미개하다며 욕을 하던 헤드 셰프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먹는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매니저녀석이 12불을 내 놓으라 합니다. 100불이 넘는 음식을 먹었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You deserve it” 한마디만 하며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분명 그 날 제가 먹었던 음식들은 식당에 쪼그려 앉아 한입씩은 먹어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맛이 달랐을까요. 맛이란 것은 혀로 느끼는 물리적, 화학적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깨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파인다이닝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날 브라이언의 손님이 되어보지 못했다면 저는 셰프뉴스를 창업해야겠단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고급 식당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누가 만들고, 얼마나 공들여 만드는 지를 알면 됩니다.
요리하는 당신을 아는 것, 그것으로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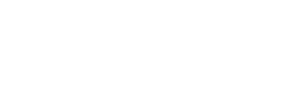

와우!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셨겠네요.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